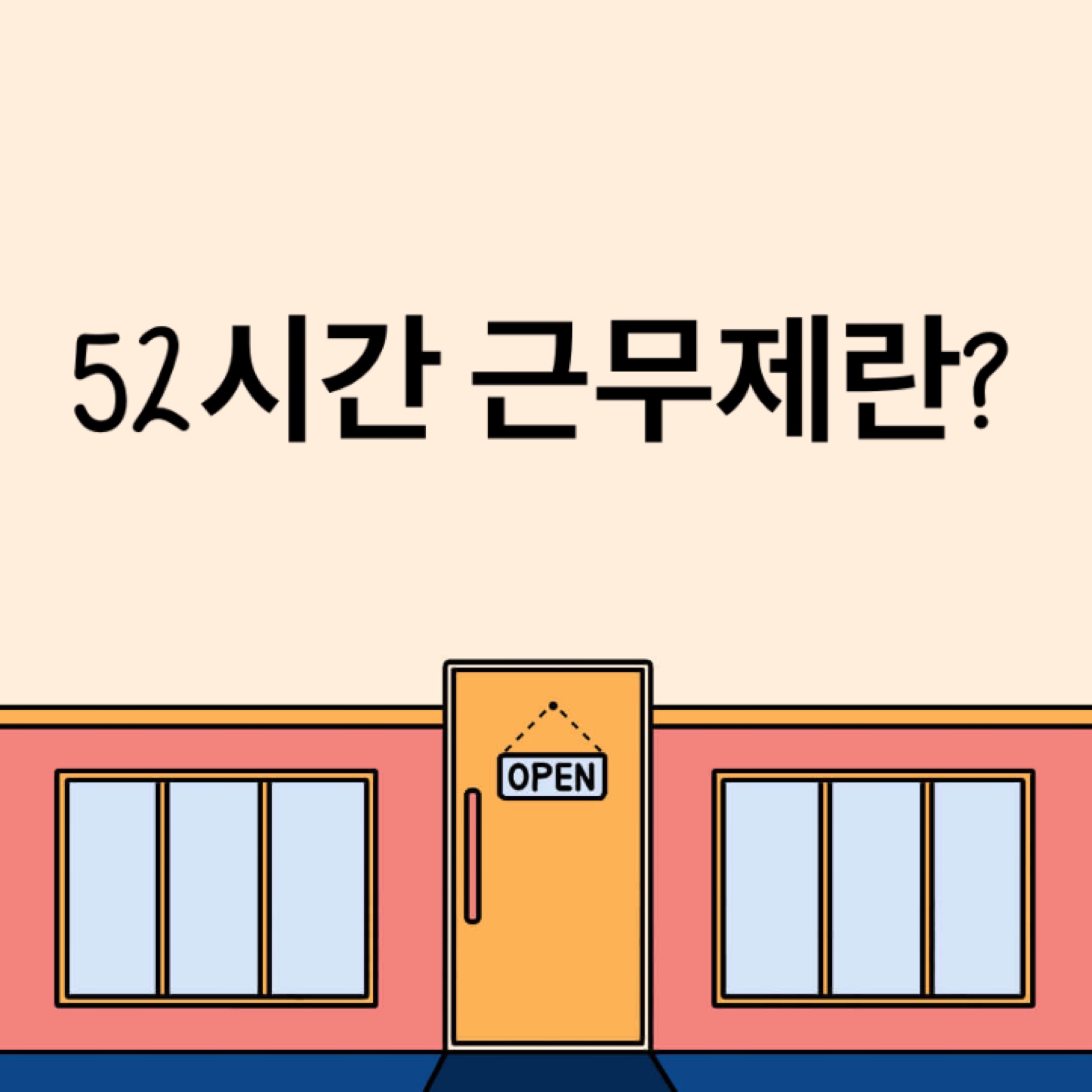
52시간 근무제
: 주당 근로 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정책
한국인의 근로 시간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통계로 입증돼 왔다.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정하는 법률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이 확정됐고, 같은 해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했다.
이전까진 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으로 주당 최대 68시간을 일할 수 있다.
이를 바꿔 법정 근로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주당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 300명 이상인 기업에는 2018년 7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은 2020년 7월,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나선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고 고용도 늘리자는 취지에서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1% 감소할 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0.79% 오르고, 산업재해율은 3.7% 감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신규 채용을 최대 13만 7000명~17만 8000명 늘리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52시간 근로제에는 명과 암이 모두 존재한다.
기업은 이전까지 관행처럼 이뤄졌던 야근과 휴일 근무를 줄이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위법이 적발되면 기업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회식과 음주문화가 줄고, 직장인의 여가가 풍부해진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가 너무 급격히 도입됐다는 비판도 많았다.
어디까지를 근로 시간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정 시점에 일이 몰리거나 연중무휴 가동되는 정보기술(IT), 금융, 보안, 운수, 서비스 등의 업종에서는 기업들이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채용을 갑자기 늘릴 여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들이 특히 많은 부담을 느꼈다.
근로 시간이 줄면서 월급까지 줄어든 저소득층 근로자가 적지 않다는 점도 정부로선 뼈아픈 대목일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다고 만든 정책이 오히려 피해를 주는 역설적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당시에도 많은 논란과 시행착오가 있었고,
모든 일터에 정착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52시간 근무제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주 52시간 근로제가 들어왔음에도 한국 임금 근로자들은 미국과 일본보다 연간 200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 가능 근로자 100명 가운데 실제 육아휴직 사용자는 5명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일, 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 시간은 1967시간이다.
1996시간 일했던 2017년보다 29시간 줄었다.
하지만 OECD 주요 회원국보다 장시간 일하고 있다.
미국 임금근로자는 연근 1792시간, 일본은 1706시간, 영국은 1513시간, 독일은 1305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 관련 용어정리 > 월급과 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금피크제 (0) | 2022.12.08 |
|---|---|
| 통상임금 간단정리 (0) | 2022.12.08 |
| 기본소득 간단정리 (0) | 2022.12.08 |
| 엥겔계수 간단정리 (0) | 2022.12.08 |
| 지니계수 / 소득 5분위배율 / 상대적빈곤율 간단정리 (0) | 2022.12.08 |